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1/02/15/QAP7RTHAOFD7FKP7AOGU5SFHJ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공자像도 파묻은 급진파 조선 유교, ‘기복신앙’ 무속은 꺾지 못했다
한승훈 원광대 교수 ‘무당과 유생의 대결’ 출간
“공자의 고향인 중국 취푸(曲阜) 대성전에 가면 황제 복장을 한 공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죠. 성균관이든 향교나 서원이든 위패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승훈(38)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는 새 연구서 ‘무당과 유생의 대결’(사우)에서 상당히 낯선 주장을 한다. “조선왕조는 성상(聖像) 파괴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급진적 종교 개혁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좀처럼 유교를 종교로서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유교는 원래 신상(神像)이나 성인의 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던 종교였다. 그러나 11세기 발흥한 신유학(성리학)은 이런 것을 불교에서 온 좋지 않은 풍습으로 봤고, 14세기 들어선 명나라에선 신상을 없애는 정책을 폈으나 잠시 일어났던 실험적인 시도로 그쳤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에서는 대단히 철저하게 실행됐다. 1566년(명종 21년) 유생 100여 명이 개성 송악산에 올라 신당 일곱 개에 불을 질렀고, 신상을 절벽 아래로 던져 버렸다. 전국의 산신이나 성황신의 상뿐 아니라, 유교의 성인인 공자의 상조차 철거 대상이었다. 1574년(선조 7년) 개성 옛 성균관의 공자와 열 제자의 상은 땅에 묻혔다. 한 교수는 “당시 신유학에 경도된 사림 세력이 성장해 ‘성스러운 존재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의 종교 개혁은 ‘무속 타파’라는 문화 전반의 개조 작업에도 나섰다. 무당은 공식적 국가 의례에서 배제됐고, 도성에서 추방당했다. 각 지방관도 팔을 걷고 지역 의례와 신당 제거에 나섰다. 그 결과 유교는 ‘공식 종교’, 무속은 비공식적 ‘민속 종교’로 자리 잡는 상하 양극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무속은 중국의 도교나 일본의 신토(神道)와는 다른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유교화’는 결국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유교는 체제 수호와 질서 유지를 맡는 공식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복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는(기복양재·祈福禳災) 분야, 망자의 영(靈)에 대한 접근권에서는 끝내 무속을 이길 수 없었다. 그 결과 유교는 종교로서의 색채를 상당 부분 잃어버린 반면 무속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한 교수는 “흔히 현대 한국 종교에서 보이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유교의 영향이고 기복주의는 무속의 영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인간이 늘 품고 있는 욕망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대 인문학부 시절 주경철 서양사학과 교수의 민담·신화 강의에 감명받아 종교학을 택했다는 그는 “무당이나 마녀처럼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산=유석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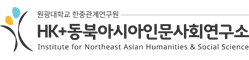


 [한승훈] “산신님, 단군님…” 그 많던 성황당은 어디로 갔을까 (중...
[한승훈] “산신님, 단군님…” 그 많던 성황당은 어디로 갔을까 (중...